[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리포트③-2]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구급차 의료진은 일당백···교육 과정 외부에도 오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리포트③-2] 노영선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장 인터뷰
높은 집중력 필요···숙련된 인력 배치 중요 특수 구급차 확대, 닥터헬기보다 유용할 것
2024.11.26. 더메디컬 이경석 기자(leeks@kaka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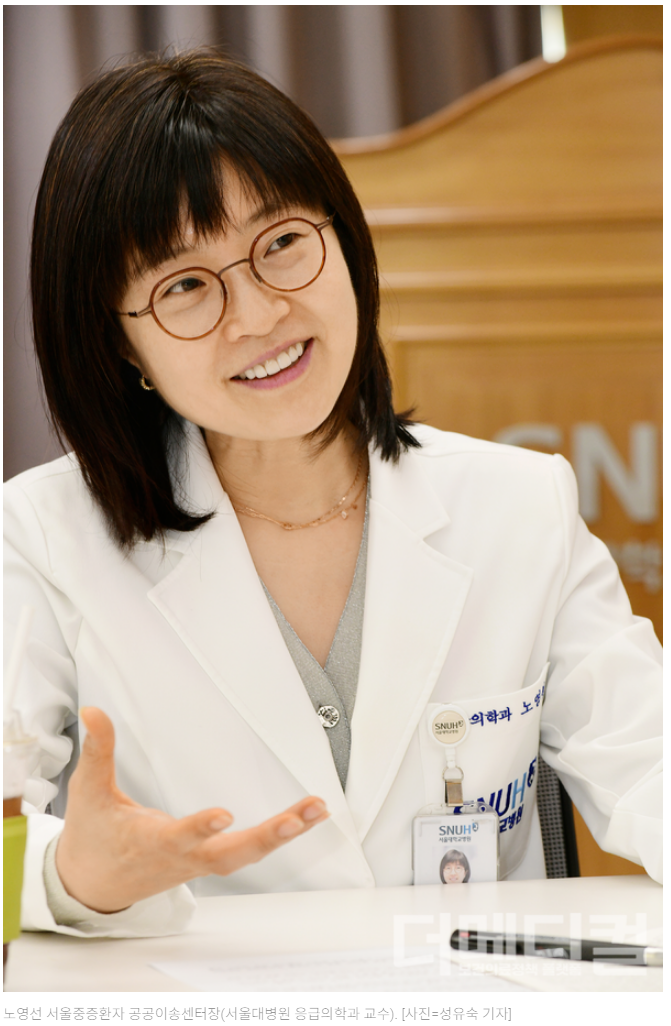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중증 환자 전문 이송팀의 사령탑은 노영선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장(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 개척하는 일이 지난했을 건 당연지사. 지난 10월 30일, 서울대학교암병원 서성환홀에서 노 센터장을 만나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이하 SMICU)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과 남은 과제를 물었다.
-2016년에 출범했다. 필요성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준비는 훨씬 오래전부터 해왔다. 현장에서는 이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중증 환자 이송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보고를 통해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주로 이송된 환자를 받는 입장인데,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져 도착하는 일이 빈번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병원 간 이송으로 75%가 나빠진다, 쇼크 환자는 더하다는 식의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보고서만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계기가 필요했다.”
-결국 예산이 장애물이었는데, 어떻게 넘어섰나?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유행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때처럼 많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걸린 사람의 치사율은 굉장히 높았다. 당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 중 의심 환자를 서울의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럴 수 있는 구급차가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관련 예산이 만들어졌고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이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일찌감치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것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이 됐다. 초기에는 10억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연간 약 50억원 규모가 됐다.”
-전담 인력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인력도 물론 문제이지만 사실 예산이 있으면 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중증 환자 전문 이송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내가 미국에서 CCEMTP(중증 환자 응급 의료 이송 프로그램, Critical Care Emergency Medical Transport Program) 과정을 이수한 게 2010년이다. 사실상 SMICU 운영을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다. 현재는 그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지난해부터는 관심 있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다. 임상 경력 2년 이상, 또는 중환자실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10주 과정을 운영 중이다.”
-기존 응급실 인력이 그대로 특수 구급차에 타면 되는 것 아닌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도착했다고 치자. 일단 의사만 2~3명, 최소한 의료진이 10명은 달라붙는다. 그런데 병원 바깥, 특수 구급차 안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응급구조사 1명뿐이다. 처치 과정을 도울 인력도, 장비도 한정적이다.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해내야 한다. 특수 구급차에 중환자실 환경을 최대한 구현했다고는 해도 일단 쓰는 장비 자체가 다르다. 응급실 환경에 숙달된 의료진도 교육 없이 투입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단 현 상황에선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송 팀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다는 점도 숙제다. 제한된 환경에서 높은 집중력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 신분이라도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대부분 촉탁직이다. 이건 사실 병원과 풀어야 할 문제다.”
-지방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SMICU가 어느 정도 확대돼야 할까.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SMICU 자체 연구 결과로는 특수 구급차가 전국에 최소 22대, 많게는 40대가량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서울과 수도권도 아주 충분한 건 아니지만 SMICU 4개 팀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으니 이제 우선순위는 지방이다. 운영 측면에선 SMICU는 시스템 구축을 돕고 각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 상황에 맞도록 운영을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은데, 결국 또 문제는 예산이다.”
-병원 간 이송이 필요 없도록 시스템을 갖출 순 없나.
“세계 어느 나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병원이 중증 환자 수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도 없고, 환자가 응급실에 가기 전에 미리 내가 무슨 질환이고 뭘 해야 하니까 이 병원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병원 간 이송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얼마 전에 강원대병원에서 이송 요청이 왔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해야 하는데 강원도 전체에 수술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환자가 에크모(체외막 산소 공급기,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달고 있어서 헬기도 태울 수 없고, 차량으로 서울대병원까지 와야 하는데 일반 구급차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SMICU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라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니면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였던 거다. 급하게 서울시와 상의하고 강원대병원에 가서 환자를 실어 왔다. 7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게 바로 전국에 특수 구급차가 필요한 이유다. 강원도에서 환자를 실어서 바로 서울로 와야지, 서울서 강원도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맞나.”
-하루빨리 전국에 특수 구급차가 도입되길 바란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닥터 헬기 한 대를 운영하는 데 연간 40억원이 든다. 그 돈이면 특수 구급차 4대를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닥터 헬기를 올해 한 대 더 늘렸는데, 사실 헬기는 운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기상 상태, 이착륙 환경 따져보면 1년에 몇 번 띄우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이 육상에서 이뤄지는데, 어느 쪽이 환자 목숨을 더 많이 살리겠나?”
출처(더메디컬 이경석 기자) :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