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리포트①-2] 김민선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장"처음 가본 길이지만 필요성 절감··· 권역별 센터로 확산돼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리포트]
김민선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장 조금 아파도 중환자실 가야하는 중증어린이 지역 의료·복지시설만으론 감당 어려워 환아 가정서 1~2시간 내 거리에 센터 구축 정부·기업·병원의 흔들림 없는 협력 필요
2024.10.08. 더메디컬 이경석 기자(leeks@kakao.com)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존재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그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다. <더메디컬>은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현재를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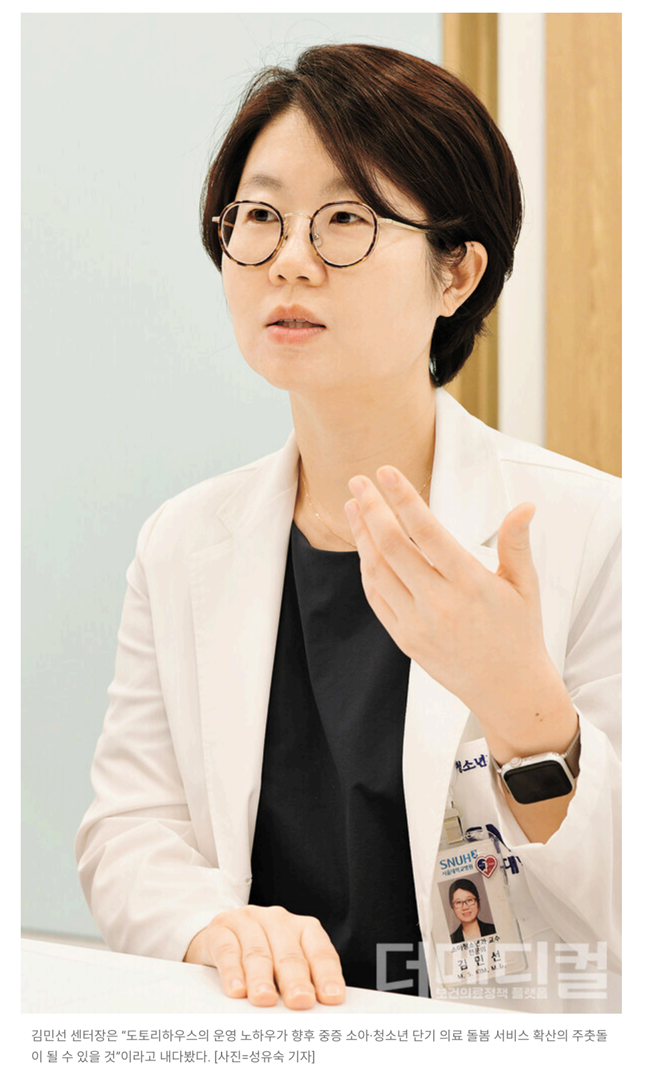
지난 1년간의 운영을 통한 성과를, 국내 최초로 시도된 중증 소아·청소년 단기 의료 돌봄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됐는지를 묻자 김민선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센터장(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은 손사래부터 친다. 처음 가보는 길인만큼, 또 쉽지 않은 의료 서비스 체계인 만큼 여전히 탐색하며 길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성과를 내세우긴 이르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숙제라고 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꿈틀꽃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기 의료 돌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가 잘 구축돼 있어서, 국내에도 지역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입할 방안을 찾아봤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건 아니다. 우리 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아플 때 오는 곳이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단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중증도가 너무 높았다. 조금만 아파도 중환자실에 가야 할 아이들인데, 지역 사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현실적으로 그럴 의료 인력도 없고, 현행법상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면 석션 하나 할 수 없는데 복지시설을 비롯해 기존 제도권 안에서는 실현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넥슨재단이 후원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시범 사업을 만들면서 센터를 열게 됐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서울대병원이 정말 큰마음을 먹은 거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건 맞는데, 적자가 빤한 일이기도 하니까. 정부(보건복지부)와 기업(넥슨재단),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이 손잡고 큰일을 벌여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사실상 셋 중 한 축만 무너져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재 의료계 상황도 불안 요소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전에 없던 의료 체계를 만드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생각할 때 이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수간호사님이 다른 데 가시면 정말 큰일난다.”
-서비스 대상 인구가 5만여 명에 달한다고.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다.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기가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로 파악할 수가 있지만 집계되지 않은, 이를테면 침 삼키기가 어려워 계속 석션을 해야하는 경우처럼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 외국 통계에 기반해 인구 대비 추산했을 때 나온 숫자가 4만~5만 명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주변 지인이 돌봐줄 수 없는, 상당 수준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센터 이용 대상이다. 수요가 많은 건 분명하지만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확대, 발전해 가야 할까.
“단기 의료 돌봄 체계를 이제 막 구축해 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향후엔 지역별로 이런 센터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의정(醫政) 갈등으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권유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은 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사태가 진정되고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면 우리 경험을 공유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광역시 단위로 5~6개 센터가 운영되는 게 국내 의료 상황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5~6개, 어떤 기준인가.
“환자 가정에서 1~2시간 거리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마련되는 거다. 우리 센터의 경우 서울·경기권에선 1~2시간이면 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멀리 부산에서 너덧 시간씩 걸려서 오게 되면 일단 센터에 도착하면 아이가 탈진한 상태다. 보호자도 지쳐 있고, 안 아팠던 아이도 아프게 된다. 현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우리와 함께 중증 소아·청소년 단기 의료 돌봄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라 대구, 경북 지역 환자를 커버해 주고 있는데, 이런 센터가 권역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자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의료진이 아무리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결국 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수년간 아이를 돌봐온 부모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 표정만 봐도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부모를 의료진이 완벽히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걸 깨닫고는 부모님께 더 많은 자료를 요청드리고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새로운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부모님들도 센터와 의료진을 믿어주시길, 또 센터를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으시길 바란다.”
출처(더메디컬 이경석 기자) :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