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에 의한 딸꾹질
덱사메타손에 의한 딸꾹질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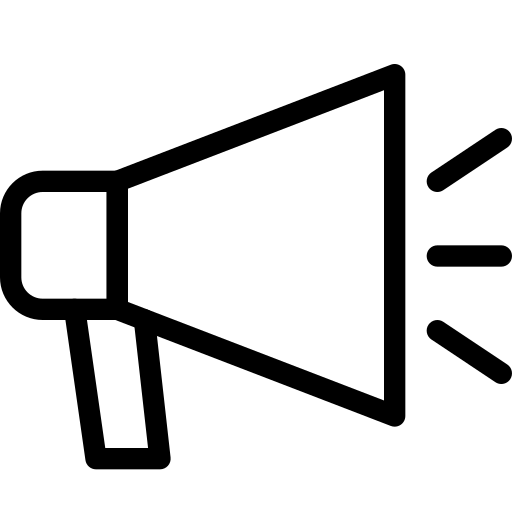 50대 남성 환자가 요관암으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 포함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면서, 항암제에 의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덱사메타손을 처방 받았다. 항암제 투약 전 덱사메타손 12 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다음 날부터 3일 간 하루 2번 4 mg씩 경구로 복용한 후, 8일 동안 지속적인 딸꾹질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바클로펜을 일주일 치 처방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었고, 다음 항암 치료에서는 덱사메타손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덱사메타손을 감량하여 투여하였고, 동일한 증상 발생하지 않았다.
50대 남성 환자가 요관암으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 포함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면서, 항암제에 의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덱사메타손을 처방 받았다. 항암제 투약 전 덱사메타손 12 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다음 날부터 3일 간 하루 2번 4 mg씩 경구로 복용한 후, 8일 동안 지속적인 딸꾹질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바클로펜을 일주일 치 처방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었고, 다음 항암 치료에서는 덱사메타손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덱사메타손을 감량하여 투여하였고, 동일한 증상 발생하지 않았다.
덱사메타손은 항암제에 의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일부 환자에게 딸꾹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딸꾹질은 ‘딸꾹질 반사궁’이라고 불리는 중추신경계 회로에 의해 횡격막 근육이 의도치 않게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대개 일시적이고 경미한 불편감을 초래하지만, 지속될 경우 불면증, 우울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며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덱사메타손에 의한 딸꾹질의 정확한 기전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딸꾹질 반사 아크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수용체에 덱사메타손이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딸꾹질을 유발한다고 제안한 연구가 있다. 둘째, 약물이 중뇌에서 신호전달을 더 쉽게 만들어 딸꾹질 반사 회로를 자극한다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또한, 덱사메타손은 혈액-뇌 장벽을 더 잘 통과하여 다른 스테로이드보다 딸꾹질 부작용을 더 강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덱사메타손에 의한 딸꾹질 발생 시, GABA (gamma aminobutyric acid) 유사체인 바클로펜을 우선적으로 투여하여 신경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바클로펜은 GABA-B 수용체에 작용하여 중추신경계의 억제성 신경전달을 증진시키고, 그로 인해 횡격막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차단하여 딸꾹질을 완화시킨다.
딸꾹질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지속될 경우 덱사메타손의 용량감량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항 구토 효과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암 환자의 항 구토 약제로 덱사메타손 대신 다른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로 변경하는것이 딸꾹질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메틸프레드니솔론으로의 전환이 항구토 효과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덱사메타손에 의한 딸꾹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임상 연구가 있다. 이 외에도 프레드니솔론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도 있다. 다만, 이러한 약물 변경전략이 임상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암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Nagata T, Watanabe A, Momo K, et al. Dexamethasone to prednisolone rotation relieved hiccup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 continuing teleworking during anticancer therapy. Clin Case Rep. 2023;11(6):e7367
2. Go SI, Koo DH, Kim ST, et al. Antiemetic Corticosteroid Rotation from Dexamethasone to Methylprednisolone to Prevent Dexamethasone-Induced Hiccup in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Chemotherapy: A Randomized, Single-Blind, Crossover Phase III Trial. Oncologist. 2017;22(11):1354-1361.
3. Lee GW, Oh SY, Kang MH, et al. Treatment of dexamethasone-induced hiccup in chemotherapy patients by methylprednisolone rotation. Oncologist. 2013;18(11):1229-1234.
